상세 컨텐츠
본문

[플레이뉴스 박순영기자] 이렇게 여성스러운 작품이 배삼식, 최우정, 정영두 3인방 남자들에게서 나왔다니 놀랍다. 지난 25일과 26일 국립오페라단(단장 최상호)이 무대에 올린 최우정 작곡가의 오페라 <화전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신작은 최우정 작곡가가 그간 그의 작품 <달이 물로 걸어오듯>(2016), <1945>(2019) 등에서 인간심리를 표현하는 노래와 격동의 시대를 표현하는 오케스트라 음악, 음악극 <적로>(2017)를 통해 전통 정가의 표현법을, 최근작 <심청>(2025)에서는 창극의 표현법을 모두 다뤄왔던 경험의 최대치를 녹여낸 결과물이었다.
우선, 최우정 작곡가와 <1945>에서도 함께 작업했던 배삼식 작가 원작의 <화전가>가 국립극단의 연극으로도 호평을 받았던 만큼, 대본자체가 해방 5년 후 한국전쟁을 세 달 앞둔 시기 여인 아홉 명의 삶과 한을 아름답고도 안동지역 사투리로 구수하게 표현하고 있다.
안무가이기도 한 정영두 연출가는 이 ‘여인’들의 결을 분홍색 톤으로 맞추고, 1막에서는 투명장막 다섯 개를 천장으로부터 길게 드리워 옛 이야기를 들여다보듯이 혹은 창호지를 뚫고 안을 몰래 보는 것처럼 은밀하고도 세심하게 느껴지게 했다. 1막에서 이 장막이 드리워져있을 때는 답답했지만, 2막에서 걷어지자 옛 이야기로 들어가는 액자형태 혹은 창호지 등의 상징성을 준 것이라고 알 수 있었다.

2막에서 여인들이 처음 “코초레뜨“(초콜릿)를 먹으며 호들갑을 떨다가 쓴 커피를 처음 맛보는 장면에서는 무용수들이 커피잔과 컵을 양손에 들고 한국전통 부채춤처럼 추도록 하여 관객들도 웃음을 자아낸 유머가 깃든 장면연출이었다. 이 때의 음악 또한 쓰디쓴 커피의 의외성을 표현하기 위해 묵직한 더블베이스로 하여 재미를 주었고, 커피장면의 처음 등장에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 음악을 넣어 역사와 연결하였다.
주인공 김씨 여인과 고모, 김씨의 세 딸과 두 며느리, 행랑어멈과 그녀가 거둬들인 수양딸까지 아홉명이 김씨의 환갑잔치를 위해 모여들고 함께 나눠먹는 초코렛과 커피장면, 그리고 환갑잔치 대신 화전놀이를 가자고 기약하는 데까지가 2막이다. 여기까지는 합창단이 ”너는 가고 없는데 봄은 다시 여기에...“라고 부르는 주제곡이 인상적이며 전쟁 때문에, 사상 때문에 남편을 아들을 잃은 여인들의 한이 가슴에 담긴 그대로 따뜻하게 그려진다.
3막과 4막은 여인들의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지며 구체적인 갈등이 드러난다. 고모가 김씨의 패물을 몰래 탐냈지만 김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막내딸 봉아와 언니 박실이 사이에 화전놀이 갈 옷을 두고 다툼이 나는 장면도 음악적으로 긴장감 있게 잘 표현되었다. 대사로 대화도 하고, 노래로 강조될 장면은 아리아로 풀었다. 오케스트라 반주는 우리말의 리듬을 강조하는 북처럼 사용되며 대사를 함께 해주기도 했다.
이 극이 막내딸 봉아의 회상으로 시작한다. 1막 처음과 4막 마지막에 봉아의 영어 시 나래이션으로 처리해 우리의 가슴 아픈 옛 사건을 만화경처럼 들여다보는 효과를 냈으며, 이 도입으로서 이후의 1, 2막 노래선율은 영어가사를 붙여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화전놀이 전날 밤 봉아가 3막에서 식구들한테 ”아무도 잠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 대사는 4막 마지막에 마치 우리의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의 옛 역사를 잊지 말고 늘 깨여있으라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또한 유명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리아 “Nessun Dorma(아무도 잠들지 마라)”를 떠올리게도 한다. 극 중 커피칸타타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이 오페라는 정통 오페라와 여러 방법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4막에서 여인들이 자신의 남자들을 회상하는 장면의 박력은 기존 오페라의 서사와 갈등요소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다. 한 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 모두들 한 자락씩 펼쳐놓는다. 내 가슴을 흔든 것은 김씨의 큰딸인 금실이가 아부지도 금서방도, 기햅이(남동생)도 이 집 남자들 모두 ”마캐등신 헛똑똑“이라며 자신이 삼팔선 넘어가서 금서방 귓방맹이 올려부칠 것이라고, 나라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리 살아야 하느냐고 한이 맺혀 노래하고 울부짖는데, 그 장면과 노래 하나로 앞 장면들이 한달음에 이 장면으로 귀결되는 듯하며, 우리 삶이 우리 한반도의 사무친 역사가 절절하게 느껴졌다.
죽은 큰아들 때문에 남아있지 말고 가라며, 큰며느리를 집에서 떠나보낸 김씨에게 고모 권씨가 “형님 가이시더 잘하셨니더”하는 부분에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 그래도 극 전체적으로 꿈틀대는 여인들 아홉의 생명력 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이 쯤에서 다시 들리는 반복되는 합창 “너는 오지 않는데 꽃은 다시 피었네”가 애절하다.
기존오페라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이번 오페라에 대해 오페라라기 보다는 연극에 가깝다, 오페라적 서사구조가 적다, 오페라적 아리아가 많지 않다 등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작곡가가 팜플렛에도 썼듯이, "과연 오페라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16세기 말 오페라가 처음 유럽에서 생겨났을 때 오페라는 '무대 위에서 하는 말로서의 노래, 노래로서의 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최우정 작곡가가 이 오페라를 준비했듯이, 그 질문은 이 땅에서 앞으로 오페라를 대하는 누구에게든 와닿는 물음이겠다.
매번 팜플렛을 자세히 읽지만 이번에는 특히 와 닿는다.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화전가>를 "한국현대오페라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썼다. 한국오페라사에 획을 그을 걸작이 하나 탄생했다.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오페라로, 여인의 삶으로 볼 수 있었다니. 그리고 꾸준히 한 길을 걸은 예술가들이 혼을 담아 만들어냈다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mazlae@daum.net
(공식페이스북) http://facebook.com/news.ewha
《세상을 플레이하라! 오락, 엔터테인먼트 전문 뉴스 - 플레이뉴스 http://ewha.biz》
'오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WHAT IS LOVE? 2025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Ⅳ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 궁극의 음악극, 국내 첫 무대!우주선 안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우주, 무한한 사랑' (1) | 2025.11.10 |
|---|---|
| '아트아우름' 오페라 봄 춘향, 서양과 동양의 하모니 영등포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0) | 2025.10.29 |
| 경기아트센터, 웹툰과 오페라의 만남 '웹툰 오페라 갈라' 웹툰 스토리와 명곡 아리아가 결합한 신개념 융합 콘서트 (1) | 2025.10.04 |
| “사랑ㆍ우정ㆍ드라마... 라벨라오페라단 '라 보엠' 뜨거운 박수 속 막 내려 (1) | 2025.09.21 |
| 국립오페라단, 북미 4개 도시 순회공연 'Opera Voyage' 개최, 한국 오페라의 미래, 북미 무대로! (1) | 2025.09.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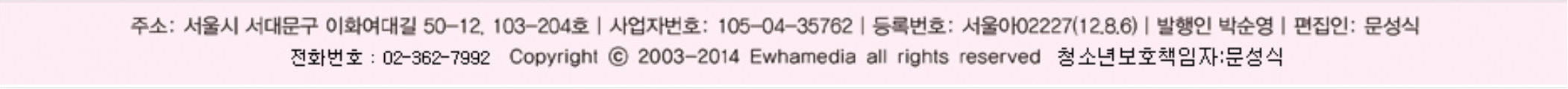





댓글 영역